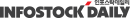[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두산건설이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수혈에 나서면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체 현금창출력이 악화된 탓에 이자 상환도 벅찬 현실이다. 주주로부터 손 벌리는 것 외 유동성 타개책이 마땅치 않다.
연이은 지원에 주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그룹 지주사인 두산 등 그룹 전반으로 신용 위험도 확산되고 있다. 두산그룹이 건설발 유동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자체 생존력 ‘뚝’… 빚 갚기도 빠듯
두산건설은 지난 21일 4200여 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금의 상당 부분은 두산중공업이 책임진다.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에 3000억원을 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중공업 역시 608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내놨다. 두산건설에 투입되는 금액(3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두산중공업에 유입되는 유동성은 절반에 불과하다.
두산건설의 유상증자는 악화된 현금창출력과 관련이 깊다. 두산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마이너스(-)522억원, -5518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 규모는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두산건설은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매출 물량의 착공 지연 △분양형사업 미수채권 조기회수 △선제적 대손충당금 반영 등을 지난해 실적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건설업 특성상 단기간 내 수익성 제고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현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규모가 유상증자로 확보할 자금과 보유 중인 현금성자산 등을 크게 웃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3월 1446억원 규모의 회사채 조기상환청구 가능시기가 도래한다. 만기를 맞는 유동화차입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6928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두산건설의 현금성자산은 1500억원 정도다.
지난해 확대된 적자 규모에 비춰봤을 때 현금성자산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외부의 도움을 받고도 빚 갚기가 빠듯한 상황이다.
◇신용 리스크, 그룹으로 전이
두산건설에서 시작된 유동성 문제는 그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두산건설 자체 생존력이 크게 둔화된 탓에 그룹 계열사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가장 큰 영향은 두산건설의 주요 주주인 두산중공업에 미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의 보통주 46.17%(4651만 5554주)와 우선주 27.21%(2741만 6329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 4조1017억원, 영업이익 1846억원을 기록하고도 두산건설과 인도법인에서 각각 6387억원과 735억원의 주식손상차손을 인식하면서 대규모 비경상 손실이 발생한 탓에 72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두산건설의 대규모 적자 여파다. 두산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자체 유동성 개선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두산 역시 두산건설의 적자가 뼈아프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두산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405억원이다. 두산건설의 손실 등 5252억원의 비경상비용이 발생해 적자로 돌아섰다.
두산인프라코어(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3942억원)와 두산밥캣(2645억원)의 호실적이 희석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의 두산건설 유상증자 참여는 두산건설의 자체 생존력이 둔화됐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두산그룹의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대한 스탠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두산그룹이 두산건설에 계속 지원한다면 그룹의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